상세 컨텐츠
본문

이 책은 서간문 형식의 세계 여행 에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걸리버 여행기 빼고는 남의 여행 이야기를 굳이 읽지 않는 편이다.
여행은 자신이 직접 가서 체험하며 몸소 느끼는 게 최고의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행을 가기도 전에 남이 가타부타 여행지를 설명하는 걸 보는 것은 내가 느껴야 할 재미와 감동에 사이다 뚜껑 열어서 김 빼는 짓과 똑같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책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분명한데 철학적 사유를 덧붙여서 읽다보면 철학 에세이 같기도 하다. 저자 신영복의 역사에 대한 견해와 심도 깊은 사색에 대해 독자인 나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을 가진 필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신영복이라는 저자가 쓴 글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책 이전에 그의 저서를 읽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서예를 배우는 사람이라 감옥에서 완성했다는 그의 서예 글씨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던 기억이 난다. 그가 만들어낸 민체에 대해 당시 서예 선생님과 서예 실력과는 상관없이 글씨체가 쓰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기도 했었다.
나는 아직 서예 글씨체를 통해 인품을 볼 정도로 서예 수준은 뛰어나진 않지만 글의 문체를 통해 작가의 인품은 조금 짐작할 수 있다. 서예와는 달리 한글은 내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써왔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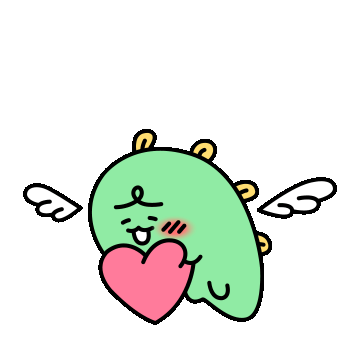
우선 이 책은 읽다보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책이다.
마치 피톤치드 효과를 내는 숲길을 걷는 기분이 든다.
이 책을 중반쯤 읽으면서 나는 어쩌면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누려온 나라에 한 국민으로 살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오만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질문대로 내 나라의 경제적 우위에 대해서 내가 다른 가난한 나라에 대해 우월감을 느껴야 할 가치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도리도리 고개를 내저었다.
다른 사람들이 금권의 위상을 좇아다니든 어떻든 간에 나는 그 가치에 의해 휘둘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내가 그런 것에 의해 문화적 우월감을 느낄 정도로 건방져져야 하는가?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를 뽑았고, 한국은 그보다 수준 낮은 독재자의 후손이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인을 선거로 뽑았던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다 타지 못한 시체가 둥둥 떠 다니는 인도의 갠지스강을 여행한 그의 글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 나라의 공공시설이 깔끔하다고 해서 꼭 의식이 미개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이 미개하다는 것은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악의 축으로 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 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경직된 사고와 폐쇄된 사회야말로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영복은 그가 다니던 여행지에 대해서만 그의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느낀 역사, 종교, 정치, 경제, 예술, 자연 등등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을 밝힌다.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독일의 아우슈비츠, 로마의 콜로세움,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브라질의 아마존, 남아프리카의 희망봉, 실크로드, 히말라야 등 그는 23개국의 여행지를 사유하며 여행한다.
그는 다른 나라의 유명 여행지에 설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걸 잊지 않는다. 그가 먼 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느낀 사색과 감명이 그 문체를 통해 내 가슴에도 전해져 온다. 그를 20년간 감옥살이 시킨 나라를 그가 얼마나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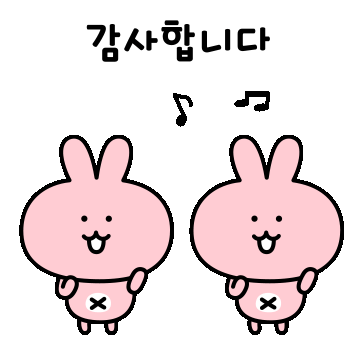
누구든지 해외에 나가면 더 자국을 생각하는 애국자가 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단순한 그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 사색하는 것이다. 그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던 그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라면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다.
‘나의 나무 아래서’를 쓴 일본의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쉘 실버스타인이나 세계의 다른 문학 작가들을 봐도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교감하려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신영복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보면 나무는 자연적 정화체로서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작가들의 탯줄 같은 존재로서도 우리 문화의 귀중한 모태라는 생각이 든다.
신영복은 23개국 세계 곳곳을 묶이지 않은 새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나서 이 책의 제목을 ‘더불어 숲’이라고 정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이 된다.
그 나무는 한 번 뿌리를 땅에 두면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평생 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그런 존재다. 하지만 나무는 한 그루 또 한 그루 더불어서 숲이 되고 산이 되어 여행객을 맞을 수는 있는 존재다.
나무는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동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저 폭력적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무를 보면서 겸손함을 배우거나 평화를 느낀다.
나와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행지의 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질감이 주는 두려움에 여행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말한다.
숲은 한 자리를 떠날 수 없음에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교류가 아니라 배움을 주고받는 쌍방적이고 동등한 만남이라고.
신영복의 에세이 ‘더불어 숲’은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숲’ 과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23개국을 여행한 ‘여행객’보다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글처럼 보였다.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며 그의 글을 읽었다.
'로긴아이 독서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을 읽고 (0) | 2022.04.03 |
|---|---|
| 독서를 하자 (0) | 2022.04.02 |
|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을 읽고 (0) | 2022.04.02 |
| 3️⃣ 이재명의 성장일기 -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를 읽고 3️⃣ (0) | 2022.04.01 |
| 2️⃣이재명의 성장일기 -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를 읽고 2️⃣ (0) | 2022.03.30 |






